역전에 간다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역전까지 가보는 ‘더’한 사랑이 그래도 역전에 미처 닿지도 못해 본 ‘덜’ 떨어진 사랑을 한 것 보다는 관계 맺기에선 차라리 낫다. 나는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생각했다.
관계/정채원
뭉그러진 복숭아를 골라낸다
저마다 단단한 씨앗을 아집처럼 품고도
가슴 부빈 자리마다 단물이 흥건하다
서로 밀착된 만큼 깊이 멍드는
사이를 조금씩 벌려 놓는다
너와 나 너무 가까워
그 누구도 끼어 들지 못하는 사이
나는 네 그늘에 가려
너는 내 솜털가시에 찔려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었으리라
그 동안, 몇 번의 천둥이 울고 비바람이 쳤는가
무너진 봉분 위에 복사꽃 지듯
가슴엔 붉은 기억 흩어져 있다
어미의 젖꼭지를 문 신생아처럼
진한 초유의 젖냄새 온몸에 퍼져 나가던 시절
초산의 젖몸살에 눈물 흘리던 시절은 이미
늙은 어미의 뭉그러진 젖무덤이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흠 없는 영혼으로 남을 수는 없을까
몇 발짝 떨어져 서로를 바라다본다
너와 나 사이로 빠져 나가는 바람이
아직 단단한 추억의 개수를 헤아린다
어디선가 뽀얀 젖냄새 실어 오는 바람 속
허공에 기댄 生이 너를 향해 기우뚱
가슴 잠시 탱탱해진다

앞의 시는 정채원(1951~ ) 시집 《나의 키로 건너는 강》(시와 시학사, 2002년)에 보인다. 시에서 하나의 그림이 불현듯 겹쳤다. 미국 출신의 프랑스 화가 엘리자베스 너스 (Elizabeth Nourse, 1859~1938)가 그린 <새신>(1910년 作)이 그것이다.
너와 나 너무 가까워
그 누구도 끼어 들지 못하는 사이
에서 엄마와 아기의 사이, 즉 관계가 확실히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와 나 너무 가까워/그 누구도 끼어 들지 못하는” 관계가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사이라고 한다면 이 관찰은 부족한 사랑의 ‘덜’ 일까, 아니면 지나친 사랑의 ‘더’라고 하는 걸까.
부족한 사랑 ‘덜’, 지나친 사랑 ‘더’
‘덜’은 말하자면 화투 게임-섯다-의 숫자 8(팔)이다. 그렇다면 ‘더’는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 생각하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십에 가까운 9(갑오)라는 수는 정녕 ‘더’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차마 그렇진 못할 테다. 오히려 ‘더’의 의미는 게임에서 판돈을 더 걸 수 있는 족보 패인 ‘땡’이라고 확장된다. 이렇듯 비유해야지 적절하다.
이른바 머니-게임처럼 셋 이상이 참여하는 사랑의 역학 관계는 결국엔 승자가 판세를 독식한다. 따라서 누가 패자가 되는지 사랑의 역학 관계에선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역사는 말한다. 성공의 기회는 시대-時-로부터 온다고 했다. ‘관계’는 항상 개인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었다. 연인이었던 둘은 연애를 청산하는 결혼이란 것을 해낸다. 신랑과 신부로 관계를 가족, 가정으로 기꺼이 형성한다. 이뿐만 아니다. 심지어는 그들 사이에 자녀가 생겨나 슬하에 두게 된다. 그렇다.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된다. 그리하여 “너와 나 너무 가까워/그 누구도 끼어 들지 못하는” 사이는 점진적으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서 생(生)에서 깨진다. 슬하(膝下)를 파고드는 자녀가 끼어 들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흠 없는 영혼으로 남을 수는 없을까
라는, 시인의 자문은 얼토당토않은 말, 그런 사유가 아니어서 빛난다. 부모라는 나와 너는 자식을 가지면 흠 없는 영혼으로 남을 수 없는 존재로 곤두박질하고 전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아이 앞에서 “몇 발짝 떨어져 서로를 바라다보”는 위치로 간격이 이동한다. 때문에 운명은 “너와 나 사이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차마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부부의 세계가 그려진다.
뭉그러진 복숭아를 골라낸다
저마다 단단한 씨앗을 아집처럼 품고도
가슴 부빈 자리마다 단물이 흥건하다
서로 밀착된 만큼 깊이 멍드는
사이를 조금씩 벌려 놓는다
이 부분은 ‘관심’이 낳은 ‘관찰’의 묘사이다. 다시 말해서 과일가게 앞에서 시적 주체가 그림을 그린 것이다. 화가처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서 관찰한 것들이 시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이다. 관심(恃), 관찰(詩), 관계(時)에 대해서 나는, 사(寺)라는 한자를 예로 부경대 대학생 인문학 캠프(지식기부 콘서트)에서 강연도 했었다(2011년).
관심(恃), 관찰(詩), 관계(時)의 3관
융회관통融會貫通의 ‘자기 관리(持) 인문학’
사(寺)라는 한자는 산에서는 절이라고 읽는다. 하지만 건축물이 도시에 나오면 관청을 뜻하는 ‘시(寺)’로 고쳐지고 발음된다.
관심은 믿음, 즉 마음(心=忄)을 토대로 한다. 그게 없으면 믿음(恃)이란 생겨날 수 없다. 이 믿음은 절 마당에 놓인 탑(言)을 주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대웅전 앞의 마당을 보자. 자세히 살피자. 비로소 대웅전(寺)과 3층 석탑(言) 합쳐지고 우리는 곧 시(詩) 자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시가 무엇인지, 왜 시가 마음을 다독이는지 찰나의 감정으로 깨우친다. 그렇다. 시란 속세의 언어가 아니다. 절간에서 나올 법한 말. 이런 청정한 무늬를 가진 말이 곧 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나는 인문학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주로 강연에서 짧았지만 설명했다. 사실 이 강연의 메시지는 나의 저서 《공자와 잡스를 잇다》(멘토프레스, 2011년)에도 나오는데 “성공하는 CEO는 시인처럼 상상하고 말한다”(188~197쪽)라고 이미 언술했다.
아무튼 핵심은 ‘관계(時)’에 있다. 관심도 좋고, 관찰도 좋지만 관계를 내가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 한마디로 ‘쑥맥’이 되고 만다. 이 ‘쑥맥’이란 낱말은 사리불변을 도통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단적으로 가리킨다. 쑥맥은 ‘숙맥불변(菽麥不辨)’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콩(菽)과 보리(麥)’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한편 ‘무식한 놈(년)’이라고 세상은 비웃고 무시한다. 시인 안도현은 「무식한 놈」이란 시에서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내세웠다. 하여, 시적 주체는 우정에 있어서 무식한 놈과의 절교를 드러낸다. 다음이 그 시이다.
무식한 놈/안도현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絶交다!
이 시는 안도현 시집 《그리운 여우》(창비, 1997년)에 나온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무식한 놈이었다. 오십이 될 때까지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잘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떠냐고? 글쎄, 자신은 없지만 구분이 이 나이엔 가능하다, 라고 나는 나를 나름 파악한다.
소설가로서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서문학상, 황순원문학상을 이미 받았고 작년에는 이상문학상도 거머쥔 이승우(1959~ )의 소설 「마음의 부력」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기에 소개한다. 다음이 그것이다.
상실감과 슬픔은 시간과 함께 묽어지지만 죄책감은 시간과 함께 더 진해진다는 사실을, 상실감과 슬픔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각적 반응이지만 죄책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자각적 반응이어서 통제하기 훨씬 까다롭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사랑의 대상인 야곱이 져야 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제법 깊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체인 리브가가 져야 했을 마음의 짐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승우, 「마음의 부력」, 《2021 제44회 이상문학작품집》, 47쪽 참조)
앞의 인용한 글을 느릿느릿, 정독하는 중에 손을 느닷없이 난 멈추었다. ‘리브가’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했기 때문이다. ‘리브가(Rebekah)’는 사람의 이름이다. 그 이름은 성경에 등장한다.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동생)과 에서(형)를 낳은 엄마의 이름인데 리브가는 ‘그물’이란 뜻, 요컨대 ‘관계’를 상징한다. 함축한다.
리브가는 엄마로서 동생을 유독 편애한 인물로 성경에선 회자된다. 그러니까 소설가 이승우 교수는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잘 짜인 빼어난 소설을 쓴 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은 예언에 너무 복종하고 충실한 나머지 에서로 향할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덜’ 떨어지게 에서를 무시하며 외면한다. 때문에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되었고 분노가 되었기에 복수에 나선 것이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동생 야곱이 ‘더’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에서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이유로 에서를 피해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쳤다. 이렇듯 두 형제의 사이가 엄마의 편애로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는 까닭을 이승우의 소설은 추적한다.
그러니까 이승우의 리브가 이야기는 독자로서 관심이 가고, 관찰이 되고, 인물들의 관계와 갈등을 파악함에 있어서 좋은 소설인 셈이다. 이토록 읽은 책들은 읽은 책들의 높이와 길이와 같이, 날로달로 쌓여간다.
결론은 말하자. 사랑은 언제나 ‘덜’ 떨어진 존재를 외면한다. ‘더’ 잘 난 존재를 편애하기 때문이다. 이를 ‘사랑의 편애성’(박혜진, 《언더스토리》, 261쪽)이라고 하자. ‘사랑의 편애성’은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활개를 친다.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다. 다시, 여성인 화가 엘리자베스 너스가 그린 <새신>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림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어떠한지 관람자는 각자 관심으로 관찰하고, 관찰로 관계를 나름나름 맺게 될 테다.
새신을 신고 기뻐하는 감정이 들었는가. 그렇다면 너는 엄마에게서 사랑을 크게 받았던 과거를 지금 추억할 것이고, 새신은 고사하고 언니가 입었던 옷과 신발을 물려받았다는 과거가 망각에서 활활 온전히 살아났는가. 그렇다면 너는 엄마에게 사랑을 ‘더’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덜’ 떨어진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대며 이따금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각이 어쩌면 강렬하게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줄 모르고 당황하며 또 허둥댄다.
그 동안, 몇 번의 천둥이 울고 비바람이 쳤는가
무너진 봉분 위에 복사꽃 지듯
가슴엔 붉은 기억 흩어져 있다
어미의 젖꼭지를 문 신생아처럼
진한 초유의 젖냄새 온몸에 퍼져 나가던 시절
초산의 젖몸살에 눈물 흘리던 시절은 이미
늙은 어미의 뭉그러진 젖무덤이다
라는, 이 부분의 시에서 독자는 아기 시절처럼 그렇게 울다가 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어미의 젖꼭지를 문 신생아”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의 상상을 불현듯 건드린다. 어디 그뿐인가. 막연하나 덜도 아닌 더한 사랑을 보여줬던 “늙은 어미의 뭉그러진 젖무덤”에서 괜스레 그리워하기 좋은 눈물을 왈칵, 하고는 쏟아낼 것이다.
“아직 단단한 추억의 개수를 헤아”리는 중의 독자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어디선가 뽀얀 젖냄새 실어 오는 바람 속”이 어디선가 서늘하게 느껴진다. 이렇다면 정말 위험천만하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허공에 기댄 生”으로 자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와 그림을 통해 “가슴 잠시 탱탱해”지는 여유-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 동안-를 마침내는 향유하고 쟁취한다. 이럴지도 혹 모를 일이다. 성경은 말하길, 끝끝내 리브가와 야곱이 해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리브가처럼 한쪽으로만 기운 편애의 그 결과는 참혹하다. ‘더’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렇다. ‘덜’ 사랑한 대상으로부터 느닷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에서가 엄마 리브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는 ‘더’한 사랑이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사실상 리브가의 고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서 기인했다. 이렇듯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지금 만나지 못하는 고통은 불어나고 증가한다. 상처는 더욱더 이전보다 부풀어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덜’ 준 사랑의 대상자에게서 비롯되는 상처는 상대적이지만 덜할 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은 생각하자면 항상 아이러니다.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어서다. 그렇기에 살아온 사랑을 추억하는 삶. 이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 사랑을 내가 더 받을 수 있길, 적잖이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더한 고통의 상처가 앞으로 나를 기다리겠지만.
역전에 간다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역전까지 가보는 ‘더’한 사랑이 그래도 역전에 미처 닿지도 못해 본 ‘덜’ 떨어진 사랑을 한 것 보다는 관계 맺기에선 차라리 낫다. 나는 이렇게 인생의 역전을 생각했다.
◆ 참고문헌
정채원, 《나의 키로 건너는 강》, 시와 시학사, 2002.
안도현, 《그리운 여우》, 창비, 1997. 28쪽 참조.
이승우, 《2021 제44회 이상문학작품집》, 문학사상사, 2021. 47쪽 참조.
박혜진, 《언더스토리》, 민음사, 2022. 261쪽 참조.
선동기, 《나를 위한 하루 그림》, 아트북스, 2012. 308~309쪽 참조.
심상훈, 《공자와 잡스를 잇다》, 멘토프레스, 2011년. 188~19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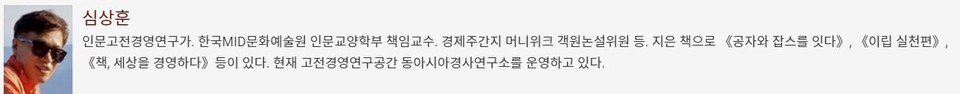
심상훈 작가·인문고전경영연구가 ylmfa97@naver.com
 심상훈
심상훈
인문고전경영연구가. 한국MID문화예술원 인문교양학부 책임교수.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객원논설위원 등. 지은 책으로 《공자와 잡스를 잇다》, 《이립 실천편》, 《책, 세상을 경영하다》등이 있다. 현재 고전경영연구공간 동아시아경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